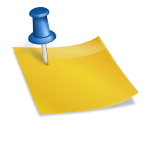OpenAI가 론칭한 ‘ChatGPT’로 반도체 산업이 되살아나면서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그 이유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때문입니다.
두 회사는 이미 코로나19가 중국 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 공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엄청난 충격파가 예상된다.그럴 것이다.
한미경제안보포럼 질문에 미국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삼성·SK에 부여된 중국 반도체 수출 유예기간 1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답했다. “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양을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대답했다.
이것은 우리가 특정 기술 수준을 넘어서는 하이테크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재가 현실화되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미세공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각각 낸드플래시 제조 공장과 반도체 후가공(패키징)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유일한 낸드플래시 해외 거점인 시안 공장은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월 27만장의 낸드디스크를 생산한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낸드 생산량(월 68만장)의 40% 수준이다.
이 밖에도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 인텔이 인수한 다롄 낸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우시 공장은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18만장의 D램을 생산하는데, 이는 동사 전체 D램 생산량의 약 48%에 해당한다.
인텔이 인수한 다롄 공장도 낸드플래시를 월 10만개 양산한다.

문제는 생산이 생산이라는 점인데 두 회사가 이미 중국에서 이 정도 규모로 생산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이 상당하다.
규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토해왔던 투자가 허공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엄밀히 말하자면 삼성전자는 2012년 중국 시안 1공장에 180억달러(약 12조원), 2017년 시안 2공장에 70억달러(약 8조원), 80억달러(약 9조6000억원)를 투자했다. 조원). )를 2019년에 추가하였다. )를 추가하여 규모를 확대하였다.
SK하이닉스 우시 D램 공장에는 이미 총 5조원이 투자됐다.
또 지난해 삼성전자 상해법인(SSS) 매출을 보면 21조3706억원으로 전년(32조3261억원)보다 10조원 가까이, 2021년(12조9389억원)보다 26.4% 줄었다. 억 원).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과 중국이 드디어 재개장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실적이 개선될지 지켜보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중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싶어도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서 장비 수입이 쉽지 않다.
최신 DRAM과 NAND Flash의 공정 전환이 빠를수록 기술 경쟁력 확보와 높은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시로 공장을 업그레이드하지만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KLA 등 최고급 장비를 공급하지 못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에 미국의 제재로 공정전환·증설에 필요한 미국 장비를 두 회사가 수입하지 못하면 양사는 폐제품을 전체의 40~50%만 사용하는 위기가 예상된다. 제품은 기술 진보없이 생산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국내 이천·청주로 장비를 이전하거나 중국 공장의 디스럽션 설비 추가 투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중국을 떠나려는 열의를 이어가고 있다.